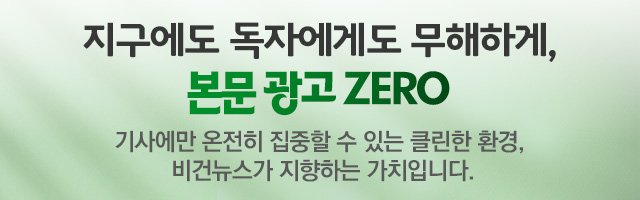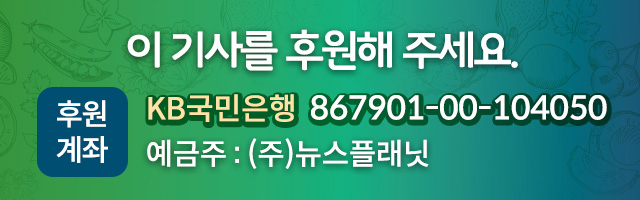[비건뉴스=김민정 기자]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연안에서 채취된 해수 1ℓ당 평균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3.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9개)보다 약 3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생활 폐기물 증가와 비효율적 수거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에서도 동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최근 3년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해와 서해 역시 10%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다.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일수록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고,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량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수거율 개선이 여전히 더디다는 점이다. 한국해양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율은 46%로, 전년(45%)보다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일본은 62%, 독일은 70% 이상을 기록하며 격차가 뚜렷했다. 이로 인해 OECD 38개국 중 한국의 해양쓰레기 관리지수는 27위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 7월 ‘해양 플라스틱 제로 2040’ 전략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발생량을 단계적으로 절반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8% 삭감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먹이사슬 전반에 퍼져 있어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며 “국가 간 협력 강화와 제조 단계에서의 감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측은 “재활용 원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친환경 제품 생산 유인이 줄고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정화 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 수산식품 기업은 지난달 부산과 여수 연안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해양 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연내 전국 주요 항만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소비자 참여형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은 플라스틱병 회수율을 90%까지 높였으며, 노르웨이는 ‘보증금 환급제’를 통해 음료 용기의 97%를 재활용하고 있다. 두 나라는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으로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기술적 대응의 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 해양환경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전기응집 방식’을 활용한 신형 미세플라스틱 제거 장비를 개발했다. 연구 결과, 기존 방식 대비 제거 효율이 약 4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내년 상반기 실증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을 미세플라스틱 저감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국민 인식 개선과 산업 구조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 오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식량과 건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복합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