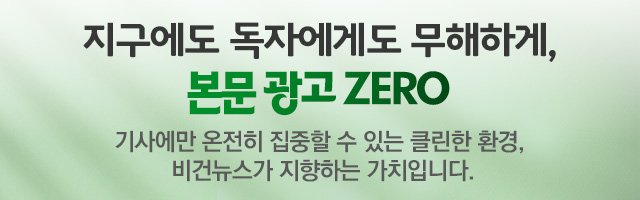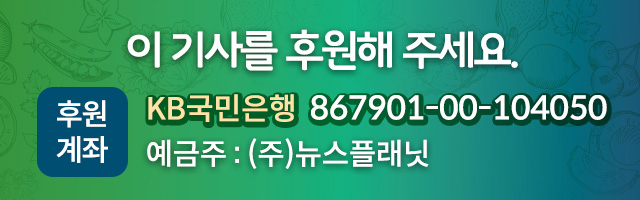[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주요 식량작물의 영양 성분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네덜란드 라이다인대학 연구진이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로, 식량 공급량과 별개로 영양 저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지적됐다. 연구는 지난 수십 년 사이 상승한 CO2 농도가 작물 생장 속도와 성분 변화를 동시에 유발해 영양 밀도를 낮추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여러 지역과 조건에서 수행된 다수의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장소·기후·재배 방식이 달랐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CO2 농도가 상승하면 작물은 탄수화물 비중이 늘고 각종 미네랄과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곡류, 과일, 뿌리작물, 잎채소 등 다양한 작물군에서 이 같은 공통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아연과 철 등 일부 미네랄 감소는 뚜렷했다. 일부 작물에서는 아연이 최대 3분의 1가량 줄어든 사례도 보고됐다. 반면 납·크롬 등 위해 금속 성분이 소폭 증가한 실험도 있어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라이다인대학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주식 작물에 의존하는 지역일수록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환경과학자 스테레 터 하르는 “식량안보를 논의할 때 포만감뿐 아니라 영양 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영양안보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터 하르 측은 기존 실험 대부분이 농업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 필수 영양소 측정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CO2 증가가 인체 영양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로 지적됐다.
작물 유형별 반응 차이도 확인됐다. 벼·밀·콩·토마토 등 C3 작물은 영양소 감소폭이 비교적 컸다. 옥수수·수수 등 C4 작물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완만했지만 일부 미네랄 변화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식물 기관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뿌리·괴경류에서 가장 큰 감소가 관찰됐고, 곡물·과일·종자류가 뒤를 이었다. 잎채소는 변화 폭이 작지만 영양 저하 경향은 동일했다.
실험 환경에 따라 변화 수준도 달랐다. 노지 실험에서는 실내 실험보다 더 큰 영양 감소가 확인됐다. 그러나 두 환경 모두 CO2 농도 증가가 작물 성분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산발적 사례가 아니라 생물학적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대기 CO2 농도 350ppm과 550ppm 조건을 비교했으며, 현재 농도는 이미 425ppm을 넘어선 상황이다. 연구진은 우리가 연구 시나리오의 중간 지점에 도달했으며, 과거 대비 영양 밀도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O2 증가 속도가 완화될 경우 영양 저하폭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연구진은 미래 농업이 영양 밀도 유지를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실 재배처럼 CO2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은 미네랄 밀도를 낮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품종 육종, 토양 관리 개선, 영양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터 하르 측은 “식품 분야의 연구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개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도시 지역 역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영양 변화는 도시 급식·병원식·공공영양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진은 “생산량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영양 품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