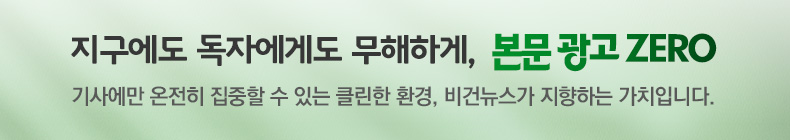요즘 우리 집은 조용하지 않다. 집사 말수가 줄었고,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복도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이었다.
집사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종이에는 고양이와 함께 페럿, 토끼, 너구리 같은 동물을 더는 키우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지금 고양이와 사는 세대는 인덕션에 안전커버를 씌우는 조건으로 3월 31일까지 유예해 주되, 그 뒤에도 꼭 나와 함께 살겠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말도 들어 있었다.
집사는 그 결정을 지난해 12월 21일 입주민 총회에서 정했고, 이후 안내문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이유도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고양이와 관련된 화재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설명이었다.
나는 그 불을 본 적이 없다. 냄새도, 연기도, 경보음도 내 기억에는 없다. 다만 분명히 아는 건 있다. 불을 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인덕션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싱크대 위로 올라가 창가를 찾고, 따뜻한 바닥을 골라 눕는 게 하루의 전부였다.
그런데도 그 안내문은 내 존재를 ‘위험’ 쪽으로 밀어 넣는 듯했다. 집사가 읽어 준 표현은 ‘요청’이었지만, 내게는 요청처럼 들리지 않았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먼저 닿았다.
이사를 준비하는 건 내 몫이 아니다. 박스를 구할 수도, 계약서를 읽을 수도, 돈을 계산할 수도 없다. 그 모든 건 집사가 감당한다. 집사는 요즘 전세와 월세 이야기를 자주 한다. 숫자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말끝이 짧아지고 한숨이 늘어날수록 거처를 옮기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무겁다는 건 느낄 수 있다.
안내문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간 뒤로 집사 휴대전화 화면에는 긴 댓글들이 이어졌다. “3개월 만에 어떻게 옮기냐”는 말도 있었고, 계약 기간이 남은 세대의 손해를 누가 책임지느냐는 지적도 보였다. 반대로 실제로 불이 난 사례가 있다면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섞여 있었다. 반려동물 금지로 운영되는 건물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관리실 쪽 설명은 집사가 들려줬다. 입주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안내했을 뿐이고, 강제라기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협조는 결국 떠나는 일과 맞닿아 있다. 익숙한 냄새와 소리, 매일 오르내리던 길을 한 번에 바꾸는 일이다. 고양이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믿어 온 시간의 축적이다.
한편으로는 집사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집사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에서 반려묘와 관련된 화재가 27건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을 읽어 준 적이 있다. 고양이가 높은 곳을 오르다 터치식 인덕션을 건드려 불이 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2024년 12월에는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반려묘가 전기레인지 버튼을 눌러 화재가 났다는 사례를 들며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나도 같다. 집사와 안전하게 살고 싶다. 다만 묻고 싶다. 위험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식이 왜 ‘나와 함께 사는 집사에게 집을 비우라’로 향하는지, 그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또 한 가지가 남는다. 집을 떠나라는 말의 끝에서, 나에게 남는 자리가 정말 있는지다. 집사가 나를 꼭 안아 올릴 때마다, 그 질문은 더 조용히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