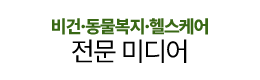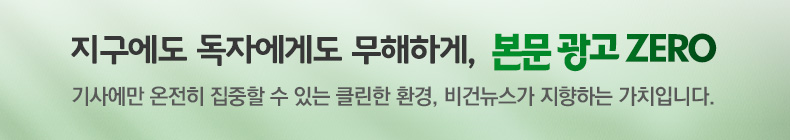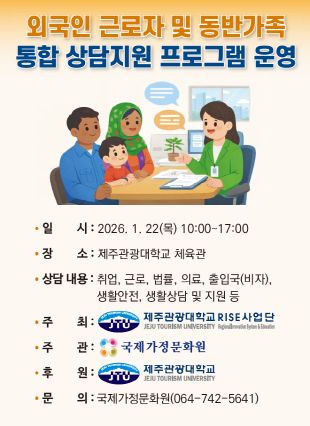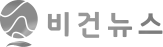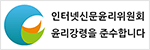[비건뉴스=최유리 기자] 폐플라스틱이 생명을 살리는 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대가 열릴까.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연구팀이 플라스틱 폐기물로 널리 쓰이는 진통제인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을 합성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장균의 유전자를 조작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약 성분으로 전환하는 이 기술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으며, 발효 공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약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 의약품 생산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케미스트리(Nature Chemistry)’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일회용 생수병이나 탄산음료 병에 주로 사용되는 PET를 먼저 테레프탈산(TPA)이라는 중간물질로 분해한 뒤, 이 물질을 대장균 내부로 들여보내 약 성분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대사 경로를 설계했다.
대장균 내부에서는 화학적으로 복잡한 ‘로센 전이 반응(Lossen rearrangement)’이 발생하며 파라세타몰이 생성된다. 이 반응은 기존 실험실에서는 고온·고압 등 극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세포 내에서는 상온·수중 환경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했다.
실험 결과, 개조된 대장균은 폐PET 유래 물질의 최대 90%를 24시간 안에 파라세타몰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1리터짜리 음료 페트병 하나로 500mg짜리 파라세타몰 정제 약 9정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산업적 생산을 위한 수율로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저비용·저탄소 환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 공정은 단일 용기 내에서 맥주 양조처럼 발효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고온이나 고압이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 소모도 적다.
연구를 주도한 스티븐 월리스(Stephen Wallace) 에든버러대학교 생명공학 교수는 “PET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병원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플라스틱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있어 미생물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 정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에든버러대학교 기술사업화 기관인 에든버러 이노베이션스도 기술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은 규모의 문제다. 실험실 수준의 소형 플라스크에서는 성공했지만, 수만 리터급 산업용 발효조에서도 동일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폐플라스틱에서 효율적으로 TPA를 추출할 수 있는 효소 기반 전처리 기술 개발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미생물 기반 의약품은 식약처 등 규제기관의 고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생산 전반에 걸친 생애주기 분석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기반 공정보다 환경성과 경제성 모두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도 인슐린이나 말라리아 치료제 전구체는 미생물 발효 방식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유사한 방식으로 파라세타몰 역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 유전자 조작, 대사 경로 설계 등을 결합한 ‘공학 생물학(Engineering Biology)’ 분야는 향후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실현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억 5천만 톤 이상 생산되며, 이 중 상당수가 바다를 떠돌거나 매립지에 버려진다. 그 생애주기는 수백 년에 이르지만, 실질적 사용시간은 불과 몇 분에 불과하다. 이번 연구는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하루도 안 돼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완결판은 아니지만, ‘폐기물과 자원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지구를 회복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생산·소비·재활용 전반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생명공학 기술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유력한 수단이며, 정책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된다면 플라스틱과 의약품, 환경과 건강의 선순환 구조가 현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