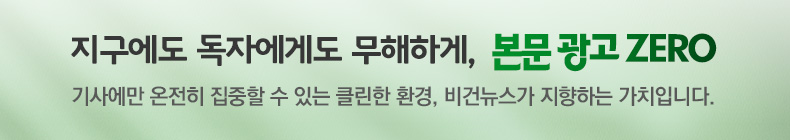[비건뉴스=김민영 기자] ‘동물을 해치지 않는 아름다움’을 향한 스텔라 매카트니의 철학이 한층 진화했다. 영국 디자이너 매카트니가 이번 2025 봄·여름 파리 패션위크에서 실제 새 깃털을 대체한 식물성 소재 ‘페버(fevver)’를 공개하며, 윤리적 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패션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스텔라 매카트니가 또 한 번 패션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번 컬렉션의 주인공은 ‘페버(fevver)’라 불리는 새로운 소재로, 새를 해치지 않고도 깃털의 섬세한 질감과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한 식물성 대체재다.
매카트니는 이번 컬렉션이 공개된 파리 퐁피두센터 백스테이지에서 “새에게서 뽑은 깃털이 패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건 늘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동물을 희생하지 않고도 패션의 극적인 아름다움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버’는 천연 염색으로 마감된 식물성 소재로 제작됐으며, 이번 쇼의 마지막 세 벌의 의상에 사용됐다. 특히 모델 알렉스 콘사니가 착용한 비대칭 라일락 드레스는 가볍고 유려한 움직임으로 현장을 압도했다.
이번 컬렉션의 테마는 ‘컴 투게더(Come Together)’였다. 배우 헬렌 미렌이 비틀스의 동명 곡을 낭독하며 쇼의 문을 열었고, 백스테이지에서는 스텔라 매카트니의 수트를 입은 미렌이 “완전히 아름다운 컬렉션”이라며 극찬을 보냈다. 매카트니는 “이 노래는 어린 시절부터 존 레논의 대표곡으로 기억됐지만, 이번엔 그 이중적 의미가 마음에 와 닿았다”며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런웨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대비가 분명히 드러났다. 여성복은 코르셋 형태의 드레이프 드레스와 페버 장식의 미니드레스가 주목을 받았고, 남성복에서는 여유로운 데님, 옆이 트인 재킷, 그리고 부드럽게 흐르는 와이드 팬츠 등이 등장했다. 전체적으로 매카트니 특유의 실용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미학이 돋보였다.
매카트니는 2001년 브랜드 론칭 이후 단 한 번도 가죽, 모피,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패션그룹 LVMH가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되사들이며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대규모 자본의 지원 없이도 친환경 패션 철학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상적인 철학만으로 현실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 최근 공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스텔라 매카트니는 지난해 2,500만 파운드(약 430억 원)의 세전 손실을 기록했다. 매출 감소로 인해 런던 본드스트리트의 플래그십 스토어 폐점도 예정돼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선택적 가치’로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매카트니는 흔들림이 없다. 그는 비건 가죽, 사과·버섯·해조류 등 자연 유래 소재를 사용해 왔으며, 이번 ‘페버’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의 표현 범위를 더욱 확장했다. 이번 컬렉션의 지속가능성 비율은 98%로, 전년도보다 2% 높아졌다. 이는 단순히 유행을 좇는 트렌드가 아니라, 패션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향한 꾸준한 실험의 결과다.
한편 파리 패션위크는 아직 런던이나 코펜하겐처럼 ‘모피 프리(fur-free)’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 많은 브랜드가 여전히 새 깃털을 위해 동물을 희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카트니의 시도는 단순한 소재 혁신을 넘어 패션계의 윤리적 기준을 재정의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패션 산업은 여전히 새로운 옷을 만드는 것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매카트니는 그러한 모순 속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왔다. 그는 “지속가능성은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스텔라 매카트니의 이번 ‘페버’ 프로젝트는 단지 깃털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패션의 본질을 다시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화려함과 윤리, 미학과 책임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그의 시도는, ‘지속가능한 럭셔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