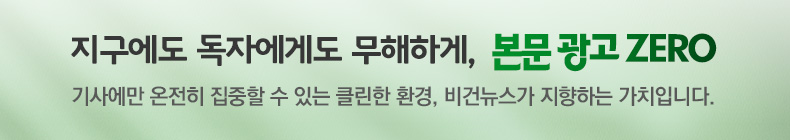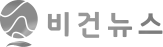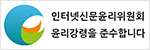산업 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가 0.85도나 올랐다. 겨우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 이는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아주 작은 기온 변화도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과학자가 밝혀냈다. 인간이 자초한 재앙, 이 시각 지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편집자주]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지구 동식물의 약 80%가 사는 바다는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 영역이자 식량 자원의 보고다.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만 살펴봐도 41.7%가 수산물로 이뤄져 있을 정도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단순한 식량 자원의 급원을 넘어 지구 생태계 유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실로 해양자원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 전 세계적 화두인 탄소배출 저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블루카본(blue carbon)’이라 일컫는다. 블루카본은 어패류나 잘피, 염생식물 등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생물뿐만 아니라 갯벌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지구의 허파’로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산림을 떠올리기 쉽다. 이를 ‘그린카본(Green carbo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블루카본의 이산화탄소 흡수 속도는 그린카본보다 약 50배나 빠르다. 이는 바다가 곧 고효율 탄소 배출구라는 의미다.

이 같은 블루카본을 활용해 해양 탄소흡수원을 보강하면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탄소흡수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1헥타르 면적에 분포한 바다 수초는 지상 산림의 평균 탄소흡수율의 2배를 상회하며 이는 726톤 석탄발전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는 양이다.
해양생태계가 범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자 이를 지키려는 세계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구에서는 매년 블루카본 생태계 0.7~7%가 환경 파괴로 사라지고 있다. 매년 영국 전체 탄소 발생량을 상쇄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이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특히 블루카본을 구성하는 잘피는 해마다 1.5%씩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잘피는 ‘바다의 숲’이라 불리는 생육지를 형성하는데 여러해살이풀로 벼와 부추처럼 생긴 모양새로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잘피는 해양생물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광합성으로 만들어내고 물고기들의 산란지·서식지를 제공한다. 특히 1㎢당 8만3000톤 탄소를 저장하는데 숲이 목재 형태로 동일면적당 3만톤 탄소를 저장하는 데 비하면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처럼 잘피는 지구 환경에 이로운 식물이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사라지고 있다. 2012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잘피 군락지 29%가 이미 개발과 수질 악화로 파괴됐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7%씩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 이후로 오염물질이 연안과 하구생태계로 유입돼 잘피생육지 70~80%가 사라졌다. 또 양식장과 무분별한 어로활동, 적조현상 등이 잘피의 감소를 가속화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07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거머리말 △수거머리말 △왕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새우말 △게바다말 등이 보호대상 행양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여년 전 자취를 감췄던 마산만 잘피숲이 돌아왔다는 희소식도 들렸다. 2008년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를 도입해 수질 개선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번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기까지는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방치하는 경우 지구와 생태계가 망가지는 속도에 비할 바는 아니다.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아주 작은 노력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