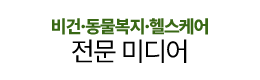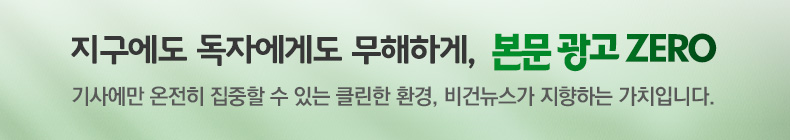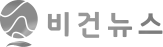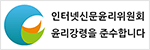[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우리가 옷장을 정리하며 자선단체에 옷을 기부할 때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필요 없는 옷을 내놓으면 그것이 필요한 이에게 전해져 다시 쓰일 것이라는 단순하고 따뜻한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실린 연구는 이러한 믿음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기부된 의류 상당수가 실제로는 지역 내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해외로 대량 수출되고 있으며, 결국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미국 오스틴, 캐나다 토론토, 호주 멜버른, 노르웨이 오슬로 등 9개 부유한 도시의 의류 기부 흐름을 추적했다. 결과는 어디서나 같았다. 자선단체와 기부센터로 몰려드는 옷은 현지 수요를 훨씬 웃돌았고, 이들 기관은 넘쳐나는 기부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일부 상태 좋은 의류만이 지역 중고 매장에서 판매되었고, 나머지 상당수는 압축 포장돼 해외로 수출됐다. 노르웨이의 경우 거의 모든 헌 옷이 국외로 빠져나갔고, 미국과 호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자선단체의 본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선단체는 사회복지와 기금 마련을 위해 존재하지 대규모 섬유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헌 옷이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가 마치 ‘폐기물 처리의 대안’처럼 작동하면서 본래의 사회적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뿌리에는 ‘과소비’와 ‘과잉 공급’이 자리한다. 패스트패션의 확산으로 의류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고, 소비자들은 더 자주, 더 많이 옷을 구입한 뒤 몇 차례 착용만 하고 쉽게 버린다. 하지만 저품질 의류는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어렵고, 중고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오히려 영세 상인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순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소비 억제를 간과하는 것은 물이 새는 배에서 양동이로 퍼내는 것과 같다”며 ‘충분성(sufficiency)’ 개념의 도입을 강조했다.
도시 차원의 대안도 제시됐다. 연구는 의류 문제를 단순한 자선의 영역으로 치부하지 말고,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 내에서 수거, 분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이 옷을 더 오래 쓰도록 수선·재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도시에서는 도서관에서 재봉틀을 대여해주거나, 옷 수선 워크숍과 교환 행사를 열고 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수선 비용을 지원해 의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고와 도시계획 역시 주요 변수다. 패스트패션 기업이 대규모 광고를 통해 소비를 부추기는 반면, 중고 매장이나 수선소는 홍보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연구진은 공공장소에서 패션 광고를 제한하고, 그 공간을 지역 재사용·수선 관련 업계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대형 쇼핑몰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대신 재사용·수선 업종이 중심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나 보조금 지원을 하는 유럽 일부 도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간단하다. 옷을 덜 사고, 오래 입는 것이다. 고쳐 입을 수 있는 옷은 수선해 쓰고, 새로 구입할 때는 오래가는 품질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의 중고 매장과 수선소, 교환 모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행동이다.
전문가들은 “기부는 과소비를 정당화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헌 옷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다가 결국 다른 나라의 매립지로 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변화는 전 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기업의 생산 방식, 도시의 관리 체계, 그리고 소비자의 생활 습관까지 모두 달라져야 한다. 연구는 “부유한 도시는 책임과 도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옷을 여전히 일회용처럼 소비한다면 어떤 제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