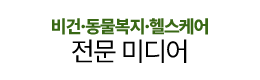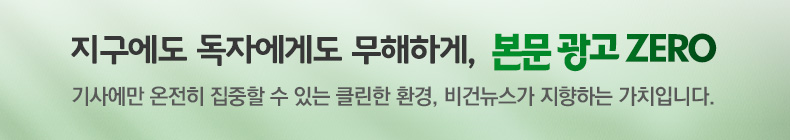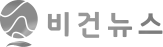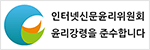[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지구 곳곳을 오염시키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에너지 저장과 환경 정화에 활용될 수 있는 탄소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학원 광저우에너지전환연구소와 화남이공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는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탄소소재로 전환하는 다양한 기술을 정리하며 ‘플라스틱의 순환 탄소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탄소 광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3억9000만톤 이상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이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계적 재활용은 품질 저하와 2차 오염 문제가 뒤따르고, 소각은 에너지 회수와 동시에 탄소배출을 늘린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연구진은 플라스틱의 주성분인 탄소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고온 열분해, 촉매 반응, 전기적 플래시 가열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플라스틱을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다공성 탄소, 탄소 양자점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광저우에너지전환연구소 가이슈 양(Gaixiu Yang) 박사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환경 부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첨단 탄소화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재사용 가능한 탄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탄소소재는 각각의 특성을 지닌다. 나노튜브는 높은 전도성과 강도를 제공하고, 그래핀은 넓은 표면적과 빠른 전자 이동성을 보인다. 다공성 탄소는 물질과 이온을 흡착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며, 탄소 양자점은 광학적 특성과 촉매 기능을 겸비한다.
특히 ‘플래시 줄 가열(Flash Joule Heating)’ 기술은 1킬로그램의 플라스틱을 0.1킬로와트시 미만의 에너지로 고품질 그래핀으로 전환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일부 공정은 혼합 플라스틱이나 오염된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어 상용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연구에서는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다공성 탄소가 셀레늄 배터리에서 이론적 한계에 근접한 에너지 저장 성능을 보이며, 리튬이온전지와 슈퍼커패시터에서도 높은 출력과 안정성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폐기물 제거와 소재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는 순환 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촉매의 내구성과 경제성, 제품 품질의 일관성, 공정 에너지 효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연구진은 재료과학·촉매공학·환경공학의 통합 연구를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저자인 화남이공대학 옌천(Yan Chen) 교수는 “폐플라스틱을 기능성 탄소소재로 전환하는 것은 오염 저감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순환 탄소경제의 유망한 경로”라며 “이 기술이 지역 단위의 폐기물 처리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서스테이너블 카본 머티리얼스(Sustainable Carbon Material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향후 청정 전력 기반의 공정과 배출 포집 기술이 결합될 경우, 플라스틱의 ‘쓰레기에서 기술로’ 전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