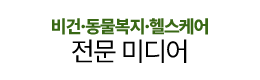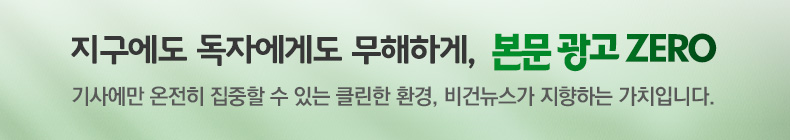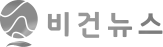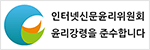[비건뉴스=김민정 기자] 매년 지구 곳곳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밀하게 계산한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이 있다. 바로 ‘지구 자체는 이 탄소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이다.
최근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의 마티아스 요나스(Matthias Jonas) 박사 연구팀은 이 질문에 물리학의 시선으로 접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지구를 ‘수동적인 온도계’가 아닌, 외부 압력을 받는 ‘스트레스를 받는 물질’로 간주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의 구조적 부담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유변학(rheology)’이라는 과학 분야의 도구를 차용했다. 유변학은 물질이 외력을 받을 때 어떻게 변형되고 흐르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나 금속 같은 공학재료에 적용된다.
연구팀은 지구를 탄성과 점성을 동시에 지닌 ‘맥스웰 물체(Maxwell body)’로 모델링했으며, 배출된 탄소에 따른 대기의 팽창과 육지 및 바다의 흡수 지연을 각각 스트레스와 변형으로 계산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스트레스 파워(stress power)’라는 개념이 도출됐다.
이는 단위 부피당 지구에 주입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단순한 온도 변화 이상으로 지구 시스템의 변형 수준을 나타낸다.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류는 매년 12.8~15.5 파스칼(Pa)의 스트레스 파워를 지구에 가하고 있었다. 이는 약한 바람 수준의 압력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의 대기, 해양, 토양 전역에 걸쳐 24시간 누적되면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요나스 박사는 이 현상을 “밤새 틀어놓은 정원 호스의 약한 물줄기가 결국 마당을 잠기게 만드는 것”에 비유했다. 낮은 강도의 압력이 지속되면 대기의 부피나 해양의 화학 조성까지 변화시키는 장기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연 흡수원의 반응성 약화가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지연 시간(delay time)’—탄소 배출과 자연의 흡수 반응 사이의 시간차—를 분석한 결과, 이 수치가 1900년대 초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육지와 바다가 1930년대 이후부터는 스트레스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흉터’를 남기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IPCC가 제시한 2025년 배출 정점, 2030년 43% 감축 목표가 달성된다 해도, 이미 약화된 자연 시스템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기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온 상승만이 아닌, 누적된 기계적 스트레스는 인프라와 생태계의 조기 노후화, 해양 산성화 등 복합적 손상을 야기한다. 연구에 따르면 남극해와 열대우림 같은 주요 흡수원의 흡수 효율은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해양의 흡수 능력은 1850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을 기존 기후 모델에 통합해, 향후에는 온도나 강수량 외에도 ‘지구 피로도(fatigue dynamics)’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빙붕 붕괴, 산림 소실 등 지역적 충격이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 파워’ 수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추적하는 것이, 온도 상승 곡선 못지않은 기후 대응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전체 환경의 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