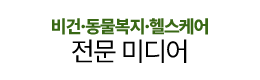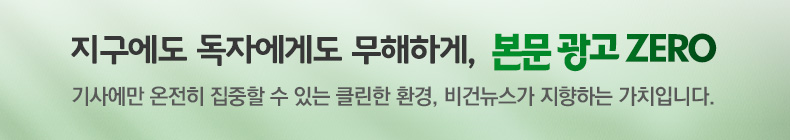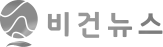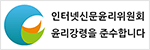[비건뉴스=박민수 기자]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기간 사회·환경적 과제로 자리해 왔다. 최근 반려묘 가정이 급증하면서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과 갈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통계청과 지자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만 약 2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묘 증가와 더불어 방치된 개체가 늘면서 생태계와 주민 갈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반려묘 수는 2010년 60만 마리에서 2020년 260만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이는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반려묘 증가에 비해 유기·유실묘 관리 정책은 상대적으로 늦게 추진돼 길고양이 개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국 7개 광역시의 길고양이 수를 약 67만7050마리에서 68만9731마리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이 어렵고 지역별 밀도 차이도 크다는 점이 정책 수립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TNR(포획·중성화·방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였던 길고양이 수를 2022년 11만6000마리로 절반 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중성화 수술 건수는 12만1537건으로, 사업비 약 226억8000만 원이 투입됐다.
서울뿐 아니라 전북 전주, 인천 남동, 대구 수성구 등 각 지자체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한 보호단체 관계자는 “TNR은 일시적 효과보다 꾸준한 관리가 핵심”이라며 “중성화 후에도 급식소와 주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 구엘프시는 도시 내 야생고양이의 개체 관리에 실패하면서 쓰레기 훼손, 번식기 소음 등으로 주민 불만이 커진 바 있다. 이후 해당 시는 지역 대학 연구팀과 협력해 중성화율을 높이고 공공 급식소를 지정한 결과, 3년 만에 개체 수가 약 35% 감소했다.
국내에서는 급식소 관리와 주민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기준 급식소 46곳을 설치해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이들 급식소의 출입 개체 중 중성화율은 약 70%에 달하며, 민원 건수도 2년 연속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길고양이는 단순한 동물 문제가 아니라 도시 생태와 주민 공존의 문제”라며 “지자체가 정확한 통계와 주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성과보다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책임 있는 급식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문제를 도시환경·공공위생·동물복지의 복합적 과제로 보고 있다. 중성화 확대, 급식소 지정, 주민 인식 개선, 데이터 관리가 동시에 이뤄질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적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는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의 지속성과 통계 기반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질 때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