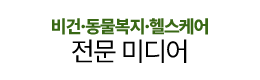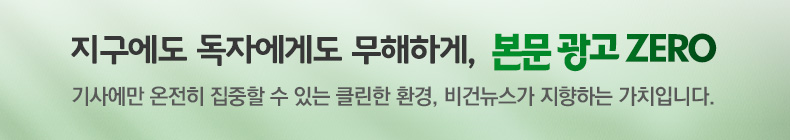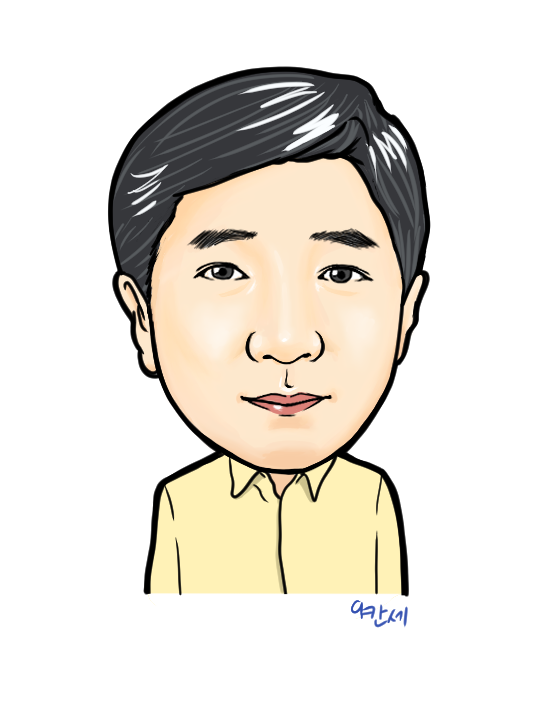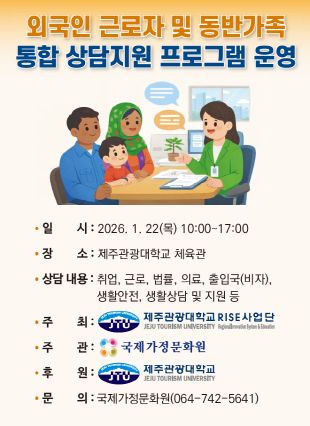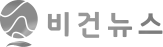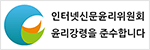[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화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지만, 원가 부담과 인프라 한계 등 과제도 여전하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스틱스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올해 17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약 440억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5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7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SKC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 소재 ‘에코프라임’을 상용화했으며, LG화학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젖산 기반 PLA(폴리락틱애시드) 수지를 양산 중이다. 롯데케미칼 역시 부산물 활용형 바이오 PET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초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국내 생산능력을 현재의 5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연구개발(R&D) 보조금 확대와 친환경 인증 절차 간소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생산 단가 문제를 최대 난제로 꼽는다. 일반 석유계 플라스틱보다 2~3배 높은 생산비용이 상용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 확보와 공정 효율화를 병행해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해 성능에 대한 오해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바이오 플라스틱은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돼 일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곧바로 친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처리 체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정부 주도의 장기 전략이 뚜렷하다. 일본은 ‘그린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의 60%를 바이오 기반 소재로 전환하기로 했고, 독일은 재활용·바이오 융합형 소재를 국가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로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농업 연계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옥수수·사탕수수 등 주요 원료 작물 재배를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계자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단기적 유행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라며 “기술 혁신과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함께 진전될 때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은 단순한 친환경 제품 확산을 넘어, 녹색산업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다.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혁신이 이뤄질 때 비로소 순환경제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